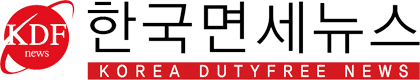2년 전쯤, 한 친구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그 아들은 그때 스물한 살이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내게도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두라고 했다. 전세를 끼고 사면 돈이 얼마 없어도 된다고 했다.
1년 전쯤, 친구가 아파트를 한 채 사겠다고 했다. 오랫동안 이혼을 꿈꾸던 친구라서 혹시, 했다.
“아냐, 그냥 한 채 사둘까 하고.”
돈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가 말했다.
“전세 끼고 사면 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괜찮냐고 나는 물었고, 그 친구는 금세 다시 팔면 된다고 했다. 2년 전쯤이면 나는 이곳 시골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때였다. 1년 전쯤이면 나는 시골책방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며 음악회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그리고 오늘 수능이 끝났다.
전국의 아파트가 연일 뉴스가 되고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요즘, 책방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강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는 책을 고르는 기준이 아이들에게 읽힐 수 있을까, 없을까였다. 성인 책이 주로인 우리 책방에서 ‘수업용’으로 아이들에게 읽힐 책은 그다지 없어 보였다.

“아이들이 '총.균.쇠'를 읽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아, 하고 말았다. 책을 읽는 목적이 다른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아이들이 읽을 책을 엄마들이 다 읽은 후 혹시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엄마들은 아이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목표가 끝나면 그다음 목표가 아이들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배우는 것이 일종의 코스로 되어 있다고.
친구 하나가 떠올랐다. 강남에 살면서 남편은 공무원이고, 아이들은 모두 ‘좋은 대학’을 다니거나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때때로 일도 하지만, 경매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소위 ‘좋은 물건’이 나오면 현장답사를 다녔다. 시골에 들어가 책방을 하겠다는 나를 그 친구는 조금 어이없어했는데, 어쩌면 그 친구는 지금쯤 아이들 명의로 아파트를 샀거나 작은 빌딩을 샀을지 모르겠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친구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다.
아이들 수업을 위해 이른바 ‘고전’으로 불리는 책을 읽고 있던 그는 다시 일어나 책방의 책을 구경하다 말을 이었다.
“강남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가 됐고,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워요. 그들은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들의 방법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는 재력가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시킵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떠올랐다. 성공한다는 게 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살았다. 그들의 성공은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 꿈의 정상에 서서 또 다른 정상을 향해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지금의 나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 귀를 기울인다. 최근에 낸 책 <살아갈수록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네요>는 평균 나이 80세인 평범한 어른들의 이야기이고, <위드, 코로나> 역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이야기다.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는 사이 나는 그들의 마음에 가만 들어간다.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느낀다.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도 매일매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일상에서 턱턱 벌어지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한다. 살아있으니 다 괜찮다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금전으로, 그리고 때로는 온 마음으로. 이러다 어느 날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맞닥뜨릴 날도 오고, 나의 죽음도 맞이할 것이다.
그가 ‘강남’ 이야기를 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통칭 ‘강남’에 사는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세상. 그가 이야기를 멈추면 나는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맞았다. 그는 몇 권의 책을 골라 한쪽에 쌓아두었는데, 나는 얼른 그 책을 팔고 싶었다. 왜? 나는 책방주인이니까.
사실 나는 ‘갭투’라는 단어를 얼마 전에야 알았다. 그리고 나는 모두 다 한다는 그 갭투를 나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며칠 조바심도 났다. 나에게 갭투를 설명한 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아이는요?”
나는 이렇게 시골책방이나 하면서 산다 해도 나중에 아이는, 이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며칠 그 생각에 마음도 불편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학교 다닐 때 무수히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나중에 아이가 원망할걸요?”

아이와 노는 내게 딱하다는 듯 주변에서 말할 때마다 귀 얇은 나는 덜컥 학원을 등록하고 새로운 과외 선생을 물색하곤 했었다. 그러다 이내 다시 아이를 앞세우고 길을 떠났지만,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절이다.
그렇게 아이와 배낭을 꾸리면서 흔들렸던 세월을 간신히 지나온 지금, 다시 ‘아이는요?’라는 말에 흔들리면서 나는 이 시골이, 책방이 갑갑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가만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미쳤을 때 그 아름답던 하늘도, 그 멋진 소나무도, 맑은 바람도 더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비로소 내가 이곳에서 좋다, 좋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바람과 꽃에 환호하고,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와서 좋아하고, 날이 흐린 날은 흐려서 좋아하는 이유는 내 안이 자유롭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간 나는 이 자유의 세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생긴 대로 살고,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나이 먹어서도 흔들리는 내 귀에 나뭇잎을 잔뜩 붙여 놓으면 되려나.
#시인 임후남은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사, 웅진씽크빅 등에서 글 쓰고 책을 만들었다. 2018년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시골책방 '생각을담는집'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펴낸 책으로는 '시골책방입니다' '아이와 길을 걷다 제주올레'가 있고 시집 '내 몸에 길 하나 생긴 후'가 있다. *이 칼럼은 포천좋은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김승태 에디터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