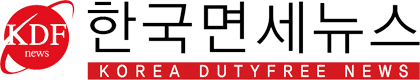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진석 의원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과 혁신위원회 설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 비판한 뒤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들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꾹참고 우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관위원 전원 구성권까지 드렸으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다 한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야멸차게 비판하시고 누군가가 바꿔야할 생각이 있다면 바꾸라고 지적하시라. 어줍잖은 5:5 양비론 사양한다"며 "3일뒤면 취임 1년이다. 1년 내내 흔들어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민주당 때리면 뒤에서 총질하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총질이고"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모든 걸 1년동안 감내해오면서 이길 가는거는 정치한번 바꿔보겠다고 처음 보수정당에 눈길 준 젊은세대가 눈에 밟혀서 그렇지 착각들 안했으면 좋겠다"며 "대선승리의 원흉 소리 들을 때도 꾹 참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혁신위원회를 통한 이 대표의 공천시스템 개혁과 우크라이나 방문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면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며 "사천 짬짬이 공천을 막기 위한 중앙당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우크라니아 방문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전하며 "이 대표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응수했다. 그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 역성드는 발언들을 많이 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대선 중 당사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 쏘고 러시아 규탄 결의안 낼 때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뜬금없이 러시아 역성들면 그게 간보는 것이고 기회주의"라고 정 의원을 겨냥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SNS에서 설전을 벌여왔다.
이 대표는 전날 SNS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의제기는 충청남도 공천에서 PPAT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고 그 사람을 안 넣어주면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왔다"며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다"고 적었다.
이어 "자기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안찍어내리고 경선한 당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자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을 거론한 글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 대표는 마치 제가 연관된 것처럼 자락을 깔았고, 언론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치욕스럽고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정치 선배의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며 "선배 정치인이 당대표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토록 큰 용기가 필요한가? 그런 공개적 위협으로 당의 언로를 막는 것은 3김 총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먼저 때린 다음 흙탕물을 만들고 '대표가 왜 반응하냐' 적반하장 하는 게 상습적 패턴"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표와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은 9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