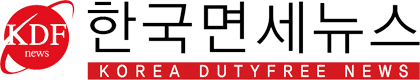글로벌 명품업체 소송 제기...“세계적 규모의 위조품 경계태세”
중국 내 단속강화조치하고 있으나 ‘효과’엔 여전히 의문
국산화장품 ‘위조’ 대책 中정부와 협업 중이나 발본색원 어려워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중 명품관 전경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중 명품관 전경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위조품 단속 및 방지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6일 “패션·의류분야 ‘알렉산더 왕’ 브랜드의 경우 이번 달에만 위조품을 공급한 459개 웹사이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총 9억 달러(한화 9,882억원) 규모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대부분 위조품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각 브랜드 업체들이 세계적 규모의 위조품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화장품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한·중 정부가 협업해 중국 내 위조 브랜드 및 제품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업체가 사법권이 없다보니 직접적으로 나서서 단속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위조품 단속 및 방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중견업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보니 자체적인 위조품 조사 및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중국 시장 진출에도 힘겨운 작업을 해나는 중에 중국 시장 내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품’은 큰 걸림돌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주요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화장품 코너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주요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화장품 코너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내 위조품 단속이 쉽진 않다. 위조품 생산·유통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들 뿐더러 해당자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국산화장품이 인기를 끌자 위조품만 아니라 브랜드명을 도용한 웹사이트까지 생겨 단속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 것이다. 화장품 관계자는 “정확히 몇 개의 브랜드 도용 및 위조 웹사이트가 있는 지 파악조차 어렵다. 또한 상표권, 지식재산권 등이 상이해 브랜드 업체가 직접 조치가 어렵다”고 전했다.
때문에 관세청은 지난 4일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하는 제도이나 그 실효성에 대해선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 제도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역직구를 비롯 K-뷰티 상품의 중국 현지 유통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증마크를 도입한다 해도 이 또한 복제돼 사용될 수 있어 위조품에 대한 발본색원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일명 ‘짝퉁’ 제품은 공식 브랜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인지도를 낮추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력(力)’ 훼손과 함께 자사가 속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엔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이 함께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활동을 점검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 ‘위조상품’ 생산 및 유통구조가 퍼져 있어 한국 브랜드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은 위조품에 대한 대대적인 소송 제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 명품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 및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걸림돌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짝퉁’ 제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화권 내 K-뷰티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중국 시장을 향한 국내 민·관·협의 합동 조치가 더욱 힘을 얻어야할 때다.